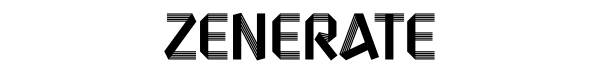로살리아(ROSALÍA) [LUX]
바벨탑이 된 헌신
“메타크리틱(Metacritic) 점수가 떨어졌다고? 우리 모두 모여 그가 죽기를 기도하자(let’s all gather and pray for his death)” 음악 유튜브 채널 더니들드롭(theneedledrop)을 운영하는 앤서니 판타노가 로살리아의 새 앨범 [LUX]에 10점 만점 기준 7점을 매기자 한 X 유저가 남긴 비판이다. 대규모 오케스트라, 합창단, 콜로라투라 가창과 플라멩코의 전통을 결합한 이 대작은 주요 매체들의 평가를 종합해 점수로 변환하는 메타크리틱에서 발매와 동시에 90점대 중후반부의 압도적인 극찬 마크를 확보한 상태였다. 전작 [MOTOMAMI]로 21세기 새로운 팝 진영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로살리아가 선공개 싱글 ‘Berghain’부터 [LUX]까지의 변신을 통해 범접할 수 없는 새 영역에 진입하였다는 것이 주된 극찬의 내용이다. 판타노의 다소 미지근한 평가가 평소보다 더 튀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 11월 18일 기준 총 222 RT, 2,300개 이상 좋아요를 기록하고 있는 유저의 게시물에 판타노는 “대신 나의 행복과 건강을 빌어달라”며 웃음 이모지를 남겼다.
오늘날 인기 팝스타의 작품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스탠(stan)의 공격일까? 재미있게도, 판타노는 앨범을 혹평하지 않았다. 그는 리뷰 영상에서 ‘올해 최고로 엔지니어링된 앨범 중 하나’, ‘업계 최고의 보컬리스트’, ‘가장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싱글’이라는 극찬을 남겼다. 단지 몇몇 순간에서 - 팝적으로 다듬어진 부분, 송라이팅의 부족 - 평소 쾌활하게 소신을 밝히던 모습과 달리, 꽤 긴장한 표정으로 아쉬움을 표했을 뿐이다. 지배적인 여론에 반대를 표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구독자 306만 명을 보유한 거대 유튜브 채널의 주인조차도 말이다.
평단의 반응을 살펴보자. 2025년의 끝자락에 등장한 [LUX]에 쏟아지는 찬사는 현재 가장 유력한 올해의 앨범 후보로 앨범을 드높이고 있다. 뉴욕 타임스 팝캐스트(Popcast)의 진행자이자 음악 평론가 존 카라마니카는 "이 사람이 유일하게 훌륭한 팝스타가 아닐지 생각한다.(is this person the only good pop star)"라는 격찬을 쏟아냈다. 뉴요커(The New Yorker)의 켈레파 사네(Kelefa Sanneh)는 플라멩코 팝과 레게톤 히트곡으로 이미 팝의 정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적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는 '팝 경제 논리'에서 급격히 벗어난 로살리아의 안티-팝티미즘(poptimism)적 태도를 주목했다.
로살리아 역시 [LUX]를 알리는 데 열심이다. 앨범이 나오기도 전에 애플 뮤직의 더 제인 로우 쇼(The Zane Lowe Show)에 출연하여 ‘MOTOMAMI를 다시 하지 않을 것 (a way of saying we are not going to do MOTOMAMI again)’이라 선언하더니,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증손녀 벨라 프로이트가 진행하는 패션 노이로시스(Fashion Neurosis) 팟캐스트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things that I'm not supposed to)”이며 “결과를 알 수 없는(when you don't know what the outcome is going to be)” 위협이라 앨범을 소개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유럽과 미국을 아우르며 진행한 세션, 13개국 언어를 활용하여 다른 문화를 배우고자 했다는 코스모폴리탄적 태도와 전문가들로부터 발음을 교정받으며 올바른 가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과정이 로살리아의 작품을 미리 듣기 전 강력한 서사의 몰입을 유도한다.
[LUX]가 역설(力說)하는 가치는 ‘헌신’이다. 하얀 베일과 구속복을 입은 채 자신을 끌어안는 앨범 표지부터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앨범에 깃든 종교적 의미를 상상할 수 있다. "1년 내내 오직 '읽고 쓰는 것'에만, 고독 속에서 오직 글쓰기라는 행위 그 자체에 자신을 복무했다"는 로살리아의 이야기는 성인(聖人), 특히 수녀이자 놀라운 시인이었던 (these nuns they were amazing poets) 여성들의 역사를 파고든다. 4개의 악장으로 나누어진 교향곡 스타일의 앨범 구성 위에서 성가와 합창단, 장엄한 오케스트라와 플라멩코 등 유럽의 전통으로 바탕을 다진 로살리아가 불러내는 이들은 역사 속 가톨릭과 수피즘, 히브리, 불교의 찬양받는 이들이다. “훌륭한 아티스트란 자신을 지우고 사라져서…. '거울'이나 '그릇'이 되는 것이다 (you erase yourself and that you disappear and that you become the mirror or the vessel)”. 로살리아가 입은 수녀복은 바로 그 '비어 있는 그릇'을 상징한다.
혼돈에서 정화에 이르는 앨범의 영적 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곡에 영감을 불어넣은 이들의 존재를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MOTOMAMI]가 추구했던 세속의 가치를 다듬어 낸 첫 곡 ‘Sexo, Violencia y Llantas’는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성인 리마의 로사와 전 세계로 흩어진 그의 유해를 통해 신성함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재배치되는지를 은유한다. 이어지는 ‘Mio Cristo Piange Diamanti’에는 성 프란체스코 수사와 아시시의 클라라가 관습적인 관계를 초월해 오직 그리스도라는 공통의 헌신으로 강렬한 영적 동반자로 거듭난 서사를 가져왔다. ‘Berghain’은 중세의 위대한 천재이자 오페라의 기원을 써 내려간 힐데가르트 폰 빙엔과 고대 인도 기녀로 불교에 귀의해 구원받은 비구니 비말라의 대비를 다루고 있다. 이외에도 ‘Focu ‘ranni’는 팔레르모의 성녀 로살리아가, ‘Sauvignon Blanc’은 스페인 아빌라에서 활동한 예수의 테레사가 등장한다.
[LUX]에서 로살리아는 이들의 영매자가 되고자 한다. 그 방식은 기술적이다. 바흐의 피카르디 3도 화성 진행(마이너 곡을 메이저로 끝맺는 기법)이나 이탈리아 오페라의 크로매틱 연결구 같은 고전적 어법을 팝의 문법 안으로 끌어온다.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소년 합창단 중 하나인 에스콜라니아 데 몬세라트와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현대적인 스튜디오부터 카탈루냐의 산타 마리아 데 몬세라트 수도원까지 실제 역사적 공간의 울림을 담아냈다. 아이슬란드의 작곡가 다니엘 비야르나손(Daníel Bjarnason)은 데이즈드(DAZED) 인터뷰에서 "로살리아는 오케스트라 녹음 과정에 극도로 실무적으로 참여했으며, 연주되는 모든 음표를 진정으로 느꼈다. 그는 강한 직관을 가졌으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험이 매우 개방적이었다"라고 증언하며, 이 엘리트적 형식이 그녀의 완전한 통제 속에 있었음을 밝힌다. 그 하이라이트가 ‘Mio Cristo Piange Diamanti’다. 한 편의 아리아를 연상케 하는 이 곡에서 로살리아는 한 음에서 다음 음으로 미끄러지듯 가창을 이어가며 인상적인 기교 습득을 증명한다. 앨범을 마무리하는 ‘Magnolias’도 마찬가지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2번 ‘부활’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오케스트라 세션, 오르간, 합창단의 음악이 승천을 의도한다.
스튜디오를 지키는 이들의 면면은 더욱 화려하다. [MOTOMAMI]의 아방가르드 팝을 함께 구축한 노아 골드스타인(Noah Goldstein), [El Mal Querer]의 동반자였던 엘 긴초(El Guincho), 다프트 펑크(Daft Punk)의 기-마뉘엘 드 오멩-크리스토(Guy-Manuel de Homem-Christo), 라디오헤드의 프로듀서 나이젤 고드리치(Nigel Godrich), 퓰리처상 수상에 빛나는 작곡가 캐롤라인 쇼(Caroline Shaw)와 퍼렐 윌리엄스(Pharrell Williams)가 이름을 올렸다. 두번째는 선공개 싱글 ‘Berghain’이다. 웅장한 오케스트라 편성, 불길한 비요크의 가창, 이브 투머의 인더스트리얼 사운드가 이질감 없이 맞아떨어진다.
유년기 수련한 전통도 빠질 수 없다. 플라멩코의 박수 리듬 빨마(Palmas)와 전율의 극한 두엔데(Duende)의 요소가 앨범의 조타수 역할을 맡는다. [El Mal Querer]의 프로듀서였던 엘 긴초와 플라멩코계의 거장 에스트레야 모렌테(Estrella Morente), 실비아 페레스 크루스(Sílvia Pérez Cruz)가 이름을 올린 화해의 춤 ‘La Rumba Del Perdón’은 로살리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똑똑히 밝힌다. 이 감정을 현대적인 테일러 스위프트 스타일의 팝에 녹인 ‘La Perla’와 긴장감 넘치는 [MOTOMAMI]의 유산 ‘Dios Es Un Stalker’ 역시 로살리아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음악적 자산을 상징한다. 토비아스 제소 주니어가 작곡에 참여한 ‘La Yugular’의 변용은 [El Mal Querer]의 충격을 연장하고, 까르미뉴(Carminho)와 함께한 포르투갈 전통 음악 장르 파두(Fado) 곡 ‘Memória’는 로살리아의 세계를 확장하려 한다.
무엇으로도 변할 수 있다는 ‘SAOKO’의 외침처럼, 로살리아가 오늘날 가장 변화무쌍하게 세계의 음악을 습득하고 있음은 분명해졌다. 그러나 [LUX]의 깊이가 기술적 성취를 넘어 깊은 감동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점 또한 서구 평론 매체가 간과하는 사실이다. 켈레파 사네의 ‘안티-팝티미즘’ 주장이 유효하지 않은 원인이다. 앨범은 팝적이지 않은 요소들로 채워진, 매우 팝적인 작품이다. ‘Mio Cristo Piange Diamanti’와 ‘Magnolia’ 정도를 제외하면 이 호화로운 편성을 길게 체험할 수 있는 곡은 거의 없다. 3~4분 내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파편화된 뮤직비디오 영상과 라이브, 수많은 인터뷰가 앨범을 조각내고 있다. 비장한 암시와 다르게 빠르게 끝나는 ‘Dios Es Un Stalker’와 ‘Mundo Nuevo’는 허탈하게까지 느껴진다. 가장 균형 잡힌 곡이 ‘Berghain’이라는 아이러니다.
정작 ‘Berghain’을 반복 재생하면서도 앨범의 강점은 약점으로 뒤바뀐다.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언어다. 13개국 언어를 습득한 로살리아는 다양한 언어로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노래하지만, 그 언어로 써내려간 가사의 깊이는 매우 얕다. ‘Berghain’의 독일어 가사 “불꽃이 내 뇌를 관통하네. 마치 납으로 된 테디베어처럼.”같은 표현은 로살리아가 커리어에서 자주 활용했던 현대 문물의 비유임에도 매우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La Yugula’에서 “골프공 안에 군대가 들어가고 / 골프공은 타이태닉을 차지하고 / 타이태닉이 립스틱 튜브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원어로도 무슨 의미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최악은 ‘La Perla’다. 4분의 3박자 왈츠 기타 연주를 기본으로 차분하게 전개하는 이 바로크 팝의 내용은 사브리나 카펜터와 테일러 스위프트의 시시콜콜한 연애담과 전 연인에 대한 집착이다. 로살리아 개인적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일본에서의 경험을 ‘Porcelana’에 옮긴 것은 좋았으나, 치밀한 교정의 과정에도 와패니즈의 시선을 감출 수는 없었다. 과거 ‘HENTAI’라는 모범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이번 앨범의 팝적인 요소는 키치한 재발견이 아니다. 팝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의식과 그 아래 잠식되어 버린 무의식 간의 대결이 혼란스럽게 다가올 뿐이다.
[LUX]를 들으며 오히려 머릿속에 맴돈 작품은 프랑스 음악가 오케이루(Oklou)의 [Choke Enough]다. 디지털의 혼돈 속에서 ‘질식’하는 개인의 경험을 레게톤, 드림 팝, 인더스트리얼을 통해 모두의 불안 체험으로 치환한 앨범은 로살리아의 공동체적이고 제도적인 가톨릭 전례와 완전히 대치된다. 로살리아는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신이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기에, 그를 위해 앨범을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 감격에 차 대답했다. 오케이루는 오피스 매거진(Office Magazine)과의 인터뷰에서 평온한 세속의 삶을 고백한다.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인생의 엄청나게 관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주 손쉽게 누릴 수 있고 실감나는 삶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는 거야.” 오케이루의 앨범이 중세 유럽의 현실 문학처럼 친근하면서도 엄숙하게 들리며, 로살리아가 꿈꾸는 공동체의 치유를 다른 방식으로 실현한 비결이다.
로살리아는 [LUX]에서 신성함과 초월적 경험을 갈망한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질문한다. 그 과정은 과장되었고 언어는 포화 상태다. [LUX]는 하늘에 닿고자 하는 음악가가 쌓아 올린 화려한 바벨탑이다. 고대와 현대의 재료를 섞어 하늘에 닿고자 했으나, 과잉된 자의식과 언어의 장벽은 비극적인 불통을 낳았다. 로살리아는 신성함을 갈망하며 인류세의 탈출과 현대인의 초월을 이끄는 빛이 되고자 했다. 안타깝게도 로살리아라는 그릇은 그 거대한 빛을 오롯이 담아내기에는 아직 작다.